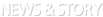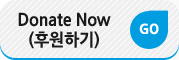포토뉴스
[인터뷰] 30년간 바람잘 날 없어도 50명 키워낸 엄마로 행복


▲ 28살의 나이로 엄마가 돼 아이들을 돌본 정순희(가운데)씨가 아이들과 상추를 다듬고 있다. 정순희씨 제공
서울 신월동 SOS 어린이 마을에 독채로 지어진 벽돌집. 현관문을 열자 성가정상이 놓여 있다. 냉장고 문에는 공룡과 동물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거실에는 색연필과 장난감이 흩어져 있다. 그 사이로 4살 된 아이가 활보한다. 혼자 뛰어다니던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종이를 내민다.
“어머니, 여기에 뽀로로 그려주세요. 물고기도요.”
낮 3시가 되자, 학교 수업을 마친 중고등학생 딸 두 명이 나란히 들어온다.
“배고프지? 거기 만두 꺼내서 데워 먹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곳 서울 SOS 어린이 마을에서 내 핏줄도 아닌 자식 50여 명을 30년 동안 키워온 엄마가 있다. 정순희(젬마, 58)씨.
지난 2월, 함께 살던 고등학생 딸 4명이 독립하면서 집을 떠났고, 이제 4살 아들과 중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딸 둘과 함께 산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싶어요. 저도 참 대범했어요. 그러고 보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느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197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씨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 수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SOS 어린이 마을을 알게 됐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SOS 어린이 마을이 서울에 생긴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동복지시설이 생겨야 한다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SOS 어린이 마을의 이념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SOS 어린이 마을의 교육 이념은 전쟁이나 가정 파탄, 아동학대 등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가정,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SOS 어린이 마을은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신뢰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독신 여성들을 찾았고, 정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곳에서 아이들의 엄마로 살기로 서약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가 꿈꿔온 수도 생활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6~7명 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옷을 해 입히고,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상상했어요.”
28살에 엄마가 된 그는 태어난 지 8시간 된 갓난아기부터 사춘기 소년 소녀까지 키워 왔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 부모의 생활고로 맡겨진 아이, 이혼부부 자녀…. 아이가 많은 만큼 아이들의 상처도 깊고 다양했다. 사춘기 아이들은 가출을 밥 먹듯 했고, 새벽에 경찰서와 오락실로 아이를 찾으러 간 일이 비일비재했다. 연탄불을 떼던 시절, 천 기저귀를 빨아 채웠고 저녁 어스름이 지면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장을 봐왔다.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만 11개를 싸주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이야 반찬은 공동으로 만들어 먹지만 당시만 해도 직접 해서 먹였습니다. 정말 진짜 엄마였지요. 저녁때가 되면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마당에 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은 모두 사회로 나갔다. 나이가 많은 자식은 마흔이 훌쩍 넘었다. 정씨가 키운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만 12명이 된다. 그렇다 보니, 명절만 되면 집이 바글바글하다. 그에게 명절은 수도자로 치면 예수 부활 대축일 같은 날. 지금까지 명절에 집에 가 본 적이 없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마음 안에 부모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으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이 텅 비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방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넘게 묵주기도를 바쳐왔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아이들 곁에 하느님 당신이 수호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정씨는 2018년이면 정년이 되어 SOS 어린이 마을을 떠난다. “이곳을 떠난다고 어떻게 키워온 자식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요.”
벌써 은퇴하면 내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자녀도 있다. 그럼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내가 키워 주는 건 비싸!”
기사전문보기: http://goo.gl/v5vteK
취재 후기
인터뷰 도중에 정순희씨 전화벨이 울렸다. 키우는 동안 엄청나게 속 썩였던 딸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다. 작년에 임신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딸 미영(가명)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딸과 손주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뭐해? 할머니 해봐~ 할머니!”
정씨는 3월 초 생일을 맞은 딸을 초대해 생일상을 차려줬다. 근데 딸이 물었다.
“엄마는 나 같은 애 어떻게 키웠어? 나는 엄마처럼 못 키우겠어.”
누구의 친엄마도 아닌데, 손발이 닳도록 빨래를 하고 똥 기저귀를 갈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평화를 누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남김없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시신 기증도 신청했다.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어서다.
그러나 욕심 없는 그에게 원하는 것 한가지 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정씨는 많은 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되어 줬다.
뉴스에는 친부모에 의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만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같은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한데 모아 가정을 만들어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들도 있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